| 세상만사 순리대로(일흔 여덟번째) | |||
|---|---|---|---|
| 작성자 | 비봉 | 이메일 | bioplant21@hanmail.net |
| 등록일 | 2010-10-06 | 조회 | 2302 |
|
주변의 푸르름이 빛을 바래고 노란 기가 도는 은행나무잎에 바람이 스치면 누런 은행이 떨어진다. 새벽녘에 스미는 한기 속에 들리는 낭랑한 귀뚜라미 소리가 까닭 모를 외로움과 그리움, 허전함을 불러낸다.
갈수록 추색(秋色)으로 변하는 농촌 들녁에 간간히 들리는 벼 베는 콤바인 소리에 김장밭의 배추가 하루가 다르게 소담스럼을 더해가는, 가을이 절정으로 치닫는 10월이다. 오늘 아침나절에 밭 끄트머리 외진 곳에 조금 심어놓고 잦은 비핑계로 제대로 챙기지 못한 고구마 밭을 돌아보니 몇일 지나면 캐야 될 것 같고 올해 처음 심은 마가 궁금해 캐보니 보통 실한 것이 아니다. 가을 걷이 준비를 하는 이웃들은 “그렇게 날씨가 안 받쳐 줬어도 지금 만 같으면 올해 벼농사는 그런대로 풍년”이란다. 밭농사도 “배추값도 지금 이니까 그렇지 김장때 가면 괜찮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날씨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흉년은 아니란다. 요즘은 일할 맛이 난다. 갑자기 내려간 기온 덕에 땀도 덜 나고 그렇게 많던 모기도 안 대든다. 모기애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올해는 유난히 모기가 많았다. 나가기만 하면 한 두 방은 기본이고 일할 때는 수십 방이다. 아무리 옷단 속을 해도 옷 위로도 물으니 별다른 방도가 없고 약을 바르고 모기향과 살충제등을 동원해도 그때뿐, 좀 지나면 더 달라 들어 어떤 때는 작업을 포기 하기도 했다. 가끔씩 방역차가 연막소독을 하지만 이 역시 별 효과가 없고 방충망 등 비교적 안전장치를 잘한 집안에서도 어느 틈을 비집고 들어 왔는지 밤새 한 두 방씩 꼭 물렸다. 도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농촌은 가을이 되니 모기 없어 좋다. 하기 사 그렇게 비가와 물웅덩이가 많았으니 모기가 얼마나 살판이 났겠는가,,, 주말만 되면 달갑지 않은 단골손님들이 몰려 들기 시작 한다. 마을 인근 야산에 밤 주우러 오는 도시민 들이다. 8년 전 처음 이곳으로 왔을 때만 해도 일거리 없는 날 밤 줍는 재미가 쏠 쏠 하고 간식 거리가 별로 인 농촌에서 밤이 한몫을 했었는데 지금은 국물도 없다. 바람만 불면 평일에도 밤 꾼들이 나타나 아주 싹 쓸 이를 해가니 가깝게 사는 주민들은 구경도 못한다. 그러니 임자 있는 밤도 아니고 ‘왜 주어 가냐고 뭐 랄 수도 없고’, 밤 뿐인가. 그 흔하던 버섯도 언제 훑어 가는지 구경을 못한다. 엊그제 앞산에 밤 주우러 갔다 만난 동네 아주머니가 “밤, 배추값 비싸다고 배추 안 뜯어 가는 것만도 다행인줄 알라”는 소리가 귓가를 맴돈다. 해서 한말 씀 드리는데 시골인심 야박하다 마시고 ‘촌 사람들도 좀 주워 먹게 좀 놔두시라’고 부탁을 하고 싶다. '시골 인심이 옛말' 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된 데는 이런 사소한 것도 한몫을 한 것이다. |
|||
| 첨부 | |||
| 다음글 | 함로(銜蘆)를 찾아라 | ||
| 이전글 | 세상만사 순리대로(일흔일곱번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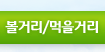




 마을소식
마을소식

